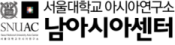초록
인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힌두교도들의 힌두국수주의와 반민주적 정치 행태의대두에 대해 반지성주의를 틀로 삼은 분석이 대두되지는 않고 있다. 미국에서 트럼프 집권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논의와는 사뭇 다른 양상인데, 표면적인 정치적 현상들의 강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정치지형에 대한 학문적 분석이 다르게 전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다면적인 다층성을 지닌 인도 사회는 식민시기부터 서구의 “종교” 개념에 맞게 전통을 재구성하여 “힌두교”를 만들어 내는 일에 주력하였지만, 서구의 “종교”에 해당하는 사회적 규범체계를 가리키는 “dharma”로서의 종교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종교집단주의(communalism)의 위험을 도외시하는 허구적 이중구조의 종교관이 만들어졌고, 이는 허구적인 ‘인도식 세속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독립시기 정치엘리트들의 경제적 실패와 세속국가 구축의 실패는 힌두국수주의(hindutva)의 흐름이 “만달 대 만디르”(Mandal vs. Mandir) 정치 구도 안에서만디르정치로 구심력을 얻는 것을 막지 못했고, 이제 힌두국수주의는 자유시장경제 이데올로기의 추동력을 얻어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반지성주의적 현상들은세속주의와 종교집단주의 간의 긴장관계 안에서 파악되어야 하는데, 근대에 재구성된힌두교가 채택한 종교관이 개인적인 체험과 해석의 궁극적 권위를 인정하는 방향을 향했다는 사실이, 미국의 최근 정치상황 분석에서 대두되는 핵심적 분석틀로서 ‘반지성주의’의 맥락과는 다른 인도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